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누가 샛길에 빠져본 적 없냐고 묻는다면 본문
샛길과 슬럼프

샛길에 빠져 방황해 본 적 없냐는 세바시의 질문은, 이 세상엔 꿈을 찾아 가는 꿈길이란 올바른 길과 그렇지 않은 샛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원래 내가 있었어야 하는 그 원래의 길로 돌아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쩌면 내가 지금 샛길에 서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히 대답하기 힘들다.
혹시 난 어딘가에서 길을 잘못 들어 지금 원래 갔어야만 하는 길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닐까?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왜 인도네시아에 와있을까? 사실은 샛길에 서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밀려 봉착한 골목에서 이게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며 정신승리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슬럼프에 대해선 분명한 기억이 있다.
슬럼프란 뭔가 왕성하던 것이 잠시 시들해진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매일 먹던 김치찌게에 물려 어느 날 된장찌개를 끓인 사건을 슬럼프라 부르지 않는다. 내가 작년 내내 듣고 다녔던 중국어 유튜브를 잠시 멈추고 올해 들어 일당백 도서소개 유튜브를 주로 듣고 있는 것도 중국어 공부에 슬럼프가 와서 그런 것 같진 않다. 다음 단계로 뛰어 넘어야 하는 선에 이르러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고 새로 발견한 유튜브 방송이 흥미롭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루에 몇 개씩 구독할 정도의 시간이 없으니 뭔가 하나를 하려면 다른 하나의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슬럼프라 할 리 없다.
내 슬럼프는 2017년 하반기에 찾아왔다. 네덜란드 소설 <막스 하벨라르 (Max Havelaar)>를 번역하던 때였다. 이슬람 축제인 이둘피트리가 시작되면서 박차를 가했던 초벌 번역은 연휴 기간에 속도를 내며 100페이지 정도를 번역해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원래 네덜란드어로 쓰인 소설이었지만 난 네덜란드어 조예가 없으니 영어 번역본과 인도네시아 번역본을 모니터에 함께 띄워놓고 양쪽을 비교하며 번역해 나갔고 그 초벌번역 결과물을 챕터별로 정리해 한국에 보내면 <막스 하벨라르> 완역 프로젝트 대장인 한국 외대 양승윤 명예교수가 네덜란드어 원서와 네덜란드어과 교수들의 도움을 받으며 번역을 완성하는 시스템이었다.
1840년의 인도네시아, 특히 반뜬 지역의 생활과 문화는 생소하기 짝이 없었고 그곳을 식민지로 경영하는 총독부 소속 고위관료의 시각은 지금의 우리 생각과 많이 달랐지만 가용한 참고자료들을 모두 동원하며 나름대로 신빙성을 담보한 번역 초안이 오역 없이 충분히 원문에 충실하게 만들어졌다고 자신했다. 그 정도 자신감도 없으면 원고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열 개 챕터 정도를 보냈을 때 양교수님의 첫 챕터 수정본이 날아왔다. 그리 길지도 않는 챕터에 내가 완전히 오역한 곳 서너 군데가 교정되어 있었고 문장과 어투도 완전히 변해 있었다. 양교수님이 거의 새로 쓰다시피 한 것이다.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 자존심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슬럼프는 무너진 자신감과 함께 찾아온다.
그로부터 한 달 넘도록 내 번역은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했다. 양교수님은 잘 하고 있다면 격려해 주었지만 내가 그 분이 만족할 만한 번역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고 그 상황에서 내가 바짝 더 노력한다고 해서 그간의 퀄리티가 획기적으로 더 좋아질 리도 없었다. 번역실력이란 건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이고 다듬어지는 것인데 어느 날 한번 스스로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닫는다고 해서 당장 대단한 반전을 이루는 게 아니다.
그렇게 내가 2017년에 초벌번역을 마치고 제출한 것을 양교수님이 완역작업을 마친 게 2018년 상반기쯤이었지만 그게 책이 되어 나온 것은 좀 더 시간이 흐른 2019년 9월 경의 일이었다. 교정교열 과정에서 양교수님이 출판사와 2년 가까이 줄다리기를 했다. 그게 내 두 번째 책이었는데 이미 수십 권의 책을 낸 양교수님이 출판사 편집장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보면 그는 슬럼프라는 걸 모르는 분 같았다.
1988년 전역할 당시 난 미리 입사한 상태였던 한화그룹에 돌아갈 지, 작전부사단장이 유혹하던 대로 군에 남아 말뚝을 박을지, 아니면 전역하고서 글을 쓰거나 작곡을 하는 프리랜서가 될 것인가 결정해야 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복직을 선택한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30여년이 흐른 지금 자카르타 하늘 아래 전업작가가 되어 있는 나는 마침내 내가 원하던 꿈길로 돌아온 것일까? 그런 지난 30여년, 난 샛길을 헤매고 있었던 것일까?
살아가야 하지만 살아내는 것이기도 한 인생에 꿈길, 샛길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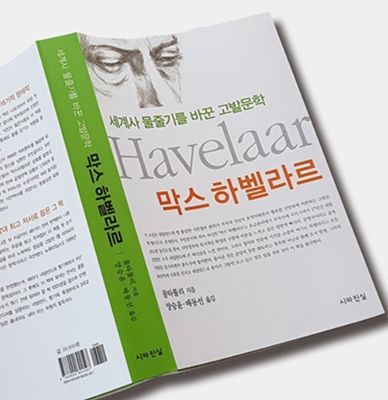
2021. 2. 27.
'세바시 인생질문 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살아온 삶의 총량을 투영하는 가치관 (0) | 2021.03.15 |
|---|---|
| 맷집 키워 뽀큐 날리는 슬기로운 생활 (0) | 2021.03.14 |
| 내 일생의 도전 (0) | 2021.03.12 |
| 호구로 살 것인가? (0) | 2021.03.11 |
| 자신의 인물평은 남이 해주는 것 (0) | 2021.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