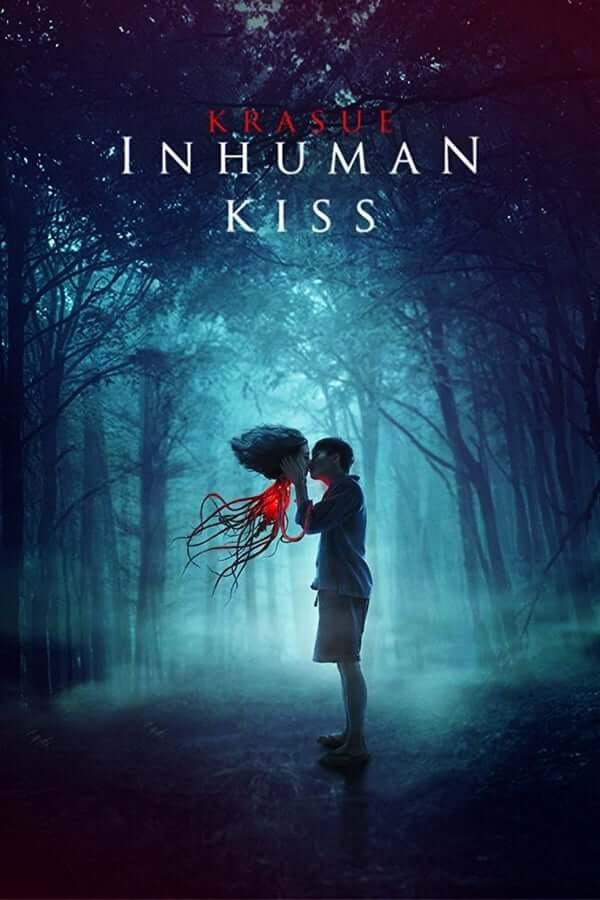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토라자의 귀신들 본문
토라자(Toraja)에도 귀신들이 살까?

토라자 사람들 중에도 독실한 무슬림이나 기독교인들이 있으니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독특한 장례문화와 가족들 시신을 매년 무덤에서 꺼내 말리고 옷을 갈아 입히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죽어도 아주 보내는 것이 아니니 일견 모든 것은 현세에 머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어찌 보면 ‘살아있는 시체들의 나라’ 토라자엔 귀신이 아예 발을 못붙일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지역, 모든 문명의 사람들이 그렇듯 토라자 사람들에게도 내세가 존재하고 다양한 귀신들이 존재한다. 그건 사실 ‘장례문화’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이미 자명한 것이다. 오늘날 토라자의 전통장례가 얼마나 많은 물소를 잡고 얼마나 성대하게 치르느냐 경쟁하며 부와 효심의 부각에 방점을 둔 듯하지만 실제로 장례란 죽은 이를 보내준다는 의미이니 매년 그 시신을 꺼내는 행위는 사실 우리들의 성묘와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일 것이다.
그래서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많은 토라자 민속의 귀신들 면면을 한번 둘러 보자.
1. 실라꾸 (Silakku)
실라꾸는 걷기 전, 이가 나기 전에 사망한 아기들의 혼에서 발생한 귀신이라고 한다.
이 유령은 새에게 붙어 이동하며 꽥 꽥 소리를 낸다. 일각에서는 실라꾸가 개, 새, 말, 돼지 같이 몸집이 큰 짐승들에게 빙의해 나타난다고도 한다. 실라꾸가 땅 위를 걸으면 그 걷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린다. 마치 귀신이 멀리 있으면 그 소리가 가깝게 들리고 귀신이 가까이 있으면 그 소리가 마치 먼 데서 들리는 것 같다는 애기와 비슷한 구도다.
실라꾸는 낮에는 짐승에게 빙의해 나타나고 밤이 내리면 악령이 된다. 즉 어둠 속에서는 짐승의 몸에 의지하지 않고도 영의 상태로 스스로를 구현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귀신은 죽음의 소식을 가져오거나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채어가거나 아이들 죽음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2. 바띠똥(Batitong_
바띠똥은 출산 중 사망한 여성에게서 발생한 악령으로 사람에게 빙의해 자신의 악한 의도를 이루려 한다는 측면에서 자바의 꾼띨아낙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마나 머리 또는 손 어딘가에 전등처럼 빛을 내거나 그런 발광체가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술라웨시 주류 귀신 중 하나인 빠띠똥(Patitong)의 특징이다. 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답지 않게 낮에도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도 그렇다.
바띠똥은 누런 이빨, 항상 눈물이 나올 듯 젖은 눈,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빈랑나무열매(sirih-pinang)에 물든 듯 푸른 입술 등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 검은 쌀로 만든 밥은 먹지 못한다. 주로 하수구나 강, 논, 늪 같이 축축하거나 물기가 많은 곳에 살며 개나 돼지 같은 동물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잘 빙의하는데 빙의된 사람은 나타내는 특징을 보고 앞에 묘사한 바띠똥 귀신의 모습을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바띠똥은 사람을 잘 해치는데 특히 임산부에게 빙의하거나 사고를 당하게 만든다. 물소 같은 동물들을 잡아먹는데 갑자기 죽은 물소의 입에서 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방금 전 바띠똥에게 잡아먹혔다는 표시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침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으로 보건데 바띠똥이 ‘잡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물소의 육신이 아니라 물소의 생명, 또는 정기 같이 물소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바띠똥을 쫒는 방법은 자락나무(Kayu jarak – 토라자 방언으로는 빨란나무(Kayu Pallan)) 가지로 때리면 바띠똥이 죽는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은 마을의 경계선에 대나무 돗자리를 펴고 그 위에 토라자의 전통 장신구인 마니까타(manikata)를 놓고 마마눅 딸루(Ma’manuk Tallu)라는 희생제를 치르는 것이다. 또 다른 퇴치법은 마을 입구에 빠사께(passakke) 잎과 깜부니(kambuni) 잎 또는 까랑불루(kerrang bulu – 토라자의 식물 종류) 잎으로 속을 채워 넣은 대나무를 세워놓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바띠동은 출산 중 사망한 임산부의 영혼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자바의 꾼띨아낙과 유사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출몰하며 발광체를 가졌다거나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거둔다는 측면에서 술라웨시 다른 지역, 특히 쓰레기장 같은 곳에 출몰하여 위독한 사람의 마지막 생명을 빨아들이며 콧 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불덩어리가 앞을 밝혀준다는 비슷한 이름의 삐띠똥(patitong)을 닮았다.
3. 수수 시디 (Susu Sidi)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우유를 달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주로 나무에 깃들어 산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유?
4. 암뿌빠당 (Ampupadang: padang은 땅이란 뜻이므로 Ampupadang은 땅의 주인)
암뿌빠당은 특정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는 영적 존재들로 사람 같은 형태를 하고 있지만 머리칼이 노랗고 바늘같이 날카로운 이빨들이 잔뜩 나 있다. 하지만 상대에 따라 사악해지기고 하고 선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일반인이 단숨에 두꾼이 될 수 있는 약을 전해주기고 하고 그들이 힘을 쓰는 지역에서는 단숨에 건물 한 채를 짓기도 한다. 말하자면 산신령이나 지박령 같은 존재다.

5. 뽀뽁(Po’pok)
뽀뽁은 사람에게 빙의하는 악마다. 구전되는 바에 따르면 뽀뽁에게 빙의되는 사람은 혈통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흑마술의 일종인 구나구나(guna-guna)를 시전하다가 실패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주화입마를 당한 셈이다. 뽀뽁은 밤에만 돌아다니는데 밖으로 나갈 때에는 자신의 위장을 집안 어디엔가 숨겨두고 가기 때문에 만약 뽀뽁을 근본적으로 퇴치하려면 뽀뽁이 나간 사이 숨겨둔 그 위장을 찾아내 소금, 고추, 식초로 범벅을 만들어 놓으면 뽀뽁이 죽게 된다고 한다.
뽀뽁은 사람과 같은 형태지만 날개가 달려 있고 돼지나 새로 변신할 수도 있다. 사람의 심장을 파먹는데 주로 엎드려 자는 사람 위독한 환자들을 즐겨 공격하고 사람과 가축들의 피도 빨아먹지만 의외로 과일도 즐겨 먹는다. 때로는 조상들과 봄보(Bombo) 같은 최근 죽은 이들의 혼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다.
일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죽어 그 혼이 뿌야(Puya – 사후세계)에 이르지 못하면 뽀뽁은 그를 살려내기 위해 모든 방법과 약재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한다.
뽀뽁 퇴치법으로 알려진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 뽀뽁에게 빈랑열매(pinang)을 던지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 뽀뽁의 본체인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집안 구석구석, 마당과 부엌에 소금을 뿌리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는다.
- 집에 주걱이나 국자 같은 것을 매달아 놓으면 뽀뽁이 접근하지 못한다.
- 자락나무가지로 딱 한 대만 때린다. 한 대 이상 때리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때린 사람이 위험해진다.
대부분의 묘사와 이름이 술라웨시 대표귀신과 다름없는 뽀뽀(poppo)와 유사하다. 하지만 뽀뽀는 빨라식이나 꾸양, 레약처럼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어 밤에 날아다니는 흡혈귀의 일종으로 저주받은 흑마술사가 방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토라자의 뽀뽁은 사람의 모습으로 배속의 위장만 빼놓고 돌아다니는 날개달린 존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뽀뽀이나 필리핀의 날개 달린 상반신 흡혈귀 마나낭갈과도 사뭇 다른 존재다.

6. 또껭꼭(To Kengkok)
또껭꼭은 인간여성의 모습인데 꼬리가 달렸고 밤에만 나타난다. 이런 묘사라면 귀신이나 유령이 아닌 건 분명하다.
7. 수악(Suak)
수악은 사람과 가축들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악령이다.
8. 니웅(Niung)
새의 모양을 하고 밤에 날아다닌다.
9. 다뚜 마루루(Datu Maruru)
천연두를 앓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귀신. 즉 우리 마마귀신이다.
10. 인도 소소이(Indo Sosoi)
이런 부류의 귀신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역병을 일으키는 인도 소소이(Indo Sosoi)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인도 빠랑아난(Indo Paranganan)이 있다.
11. 라룬둔(Lalundun)
라룬둔은 키가 크고 머리칼이 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과 귀신 중간 정도 성격인데 높은 기둥처럼 보이기도 하고 짐승의 모습으로 현신하기도 한다. 때로는 땅 속으로부터 솟아나와 점점 커져 큰 나무 만한 크기가 된다. 주로 밤에 나타나는데 밤길에 라룬둔은 만난 사람은 라룬둔과 싸워야 한다. 지면 죽고 이기면 그를 평생 지켜줄 부적을 얻게 된다.
12. 빠꼬니(Pakoni), 블라징(Belajing), 빠라깐(Parakan)
빠꼬니, 블라징, 빠라깐 등은 인간에게 빙의하거나 인간, 가축을 공격해 그 피를 빨아먹는 악마다. 때로는 농작물을 해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슴도치의 가시나 자락나무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효과가 있다.
13. 진(Jin, 징(jing)이라고도 함)
진은 뚜율처럼 사람이 키우며 이것저것 시킬 수 있는 사역마다. 진을 키우는 사람이 막 도살한 가축의 피를 마시면 진의 힘이 더욱 커진다. 진은 닭, 물소 같은 짐승은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찹쌀과 달걀 노른자를 주식으로 한다.
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는데 주로 음산하거나 성스러운 장소 또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을 좋아한다. 진은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살인이든, 희생자의 심장을 파먹는 일이든, 주인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일이든 뭐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거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 정도의 위력이다. 진을 막으려면 진이 사는 곳 일대에 녹슨 쇳가루를 흩뿌려 놓는 방법이 있다.
14. 세땅(Setang)
세땅은 사람이나 짐승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귀신으로 사람에게 빙의하기도 하고 노란 머리칼과 이빨을 가졌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다른 귀신들과 딱히 구분하기 어렵다.
15 봄보(Bombo)
봄보는 임종직전에 있는 사람의 혼 도는 이미 죽은 사람의 유령으로 가벼운 신음소리같은 특별한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다. 주술의식이 제대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길들여질 수도 있고 난폭한 악귀가 될 수도 있다. 봄보의 접근을 막기 위해 물소가 밟고 간 물로 얼굴을 닦거나 대나무 잔가지나 야자 잎의 줄기부분을 가지고 다니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술라웨시에 같은 이름을 가진 지박령 성격의 귀신이 있는데 토라자의 봄보와는 인상착의가 사뭇 다르다.
16. 뽄띠아나(Pontiana)
말레이시아에서 말하는 뽄띠아낙(Pontianak)의 의미와 상당히 가까운데 출산 중 사망하거나 소녀 시절에 죽은 여성의 혼을 말한다. 주로 밤에 나타나며 묘지나 자신이 출산하다가 사망한 장소에 모습을 보인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현신하지만 머리카락과 손톱이 길고 좀처럼 등을 보여주지 않는다 (순델볼롱의 특징). 뽄띠아나가 무조건 남자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남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뽄띠아나를 피하려면 야자 잎줄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다른 여성에게 피신하거나 출산 중 죽은 여인의 묘지에 달걀을 가져다 놓고 그 무덤 위에 바늘을 꽂아 놓는 등의 방법이 있다. 여성들은 출산 중 죽은 여인의 집에서 주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
17. 삼뿌라리(Sampurari)
삼뿌라리는 주로 짐승 모습으로 현신하는 악령으로 때로는 적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삼뿌라리는 마치 엄청난 인원의 군대가 내는 소리를 내면서 적들을 몰아낼 수 있다. 농작물을 해치거나 훔치는 사람들을 먹어치운다는 점에서 바딱의 버구간장(Begu Ganjang)과의 유사점도 보인다. 삼뿌라리와 마추치지 않으려면 절대 그 이름을 입에 올려서는 안된다.
18. 빠나다라(Panaddara)
빠나다라는 숲 속에 사는 신비한 여성종족으로 나체에 큰 유방, 안젤리나 졸리 풍의 두꺼운 입술을 하고 나타난다. 그 모습에 혹해 남성이 접근하려 하면 깔깔 웃으며 입술을 까뒤집는데 더욱 두터워진 입술이 급기야 눈까지 가리는 기괴한 모습이 된다.
19. 인도오론(Indo Orron)
늑대처럼 울부짖는 여신으로 사나운 짐승의 모습으로 현신하여 사람의 눈을 파먹는다.
20. 인도 오로오로(Indo Oro’ Oro’)
숲 속에 살며 인간의 정기를 좋아하는 이 여자귀신은 통통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 뻐나다라의 또 다른 버젼으로 보인다.
출처; 꼼빠네시아
'인니 민속과 주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속과 괴담 사이(23)] 살아있는 시체들의 나라 (0) | 2021.11.01 |
|---|---|
| 토라자의 알룩 또돌로 신앙 공동체 (0) | 2021.10.31 |
| 귀신 방지 백신 (0) | 2021.10.28 |
| 코로나 팬데믹에 내몰린 귀신들의 할로윈 (0) | 2021.10.25 |
| [무속과 괴담 사이 (22)] 흉가와 도시괴담 (0) | 2021.10.17 |